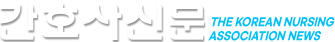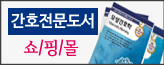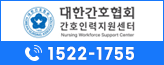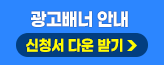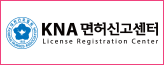의료기관 근로자 건강관리 의무
이 성 은 교수(관동대 간호학과)
[관동대 간호학과 교수] 이성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4-08 오전 10:48:29

지난해 7월 12일 개정 공포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근로자 건강관리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골자를 보면 유해화학물질을 168종으로 확대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관리 및 생물학적 유해인자 관리, 사무실 환경관리 및 분진작업 및 농업종사자 건강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이중 생물학적 유해인자 관리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직결된다. 즉 약간은 치외법권적 성격을 지녔던 의료기관 근로자의 건강문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관리되고 의료기관의 산업보건프로그램은 지방노동사무소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의해 근로자 50인 이상의 의료기관은 올해 6월 30일까지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보건관리자를 배치해 직업병 예방관리프그램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장 보건관리자는 간호사, 의사, 위생기사 등이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특성상 보건관리자는 이미 전담보건관리자를 두고 근로자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고대 구로병원과 안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의 예에서 보듯이 간호사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수를 감안할 때 의료기관에서의 산업간호사 수요는 2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기관은 전문의료인이 모여있는 사업장인만큼 산업간호사 역할 또한 전문성을 기대할 것이므로, 의료기관의 산업간호사는 산업전문간호사가 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의 산업보건프로그램은 다른 사업장의 산업보건프로그램과 근본적으로 틀을 같이 한다. 미국 CDC(질병관리센터)의 NIOSH(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1988년 발간한 의료기관 산업보건안전지침에 소개된 의료기관 산업보건사업의 내용은 크게 유해요인의 종류와 보건안전프로그램의 발전전략, 안전지침, 감염성질환 관리지침, 비감염성질환 관리지침, 유해쓰레기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많은 보건의료인이 있는 사업장이므로 산업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좀더 동반자적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산업보건사업은 경제발전의 논리에 눌려 소극적 입장을 취했고 보건관리자의 역할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긴장 속에 법적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렵사리 시작한 의료기관의 산업보건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산업(전문)간호사는 이러한 수동적 입장에서 탈피해 의료기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앞장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나아가 의료인들이 산업보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근로자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