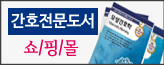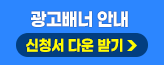제25회 간호문학상 소설부문 당선작 - 푸른웃음 그리기
박정혜(경남 덕계 성심병원)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12-23 오전 08:52:22
니가 누고?
난데없는 뚱딴지 같은 질문에 어머니는 섭섭했을 것이다.
"몇 번이고 그라카드라. 느이 외할매가 말이다."
칠순 어머니는 숨 가삐 아흔 고개를 넘으신 외할머니를 만나 뵙고 오시더니 연거푸 똑같은 말을 한숨처럼 내뱉으셨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복도 많지. 아부지가 그렇게 수발을 들어주시니…"
뒷말을 흐리는 어머니의 갈라진 음성 위로 마른 먼지가 풀썩거린다. 홀로 되신 지 십 년이 되는 동안 어머니는 다부지게 틈 하나 없이 살아 오셨지만, 먼지는 어쩔 수 없이 더께를 이루고 있다가 어느 순간 투툭 불거지곤 한다. 그것은 어머니의 말투에서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 스스로는 외로움을 매번 수장시킨다. 외로움들은 하루에도 수 십 번씩 물걸레질을 하는 어머니의 갈퀴진 손 안에서 숨을 죽인다.
이제는 했던 말만 똑같이 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 석이가 즈이 엄마보고 엄마요, 할매한테 잘 하이소. 안 그러면 내 이담에 커서 나도 어머니한테 똑같이 할겁니더 했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하는 기라. 느이 막내 이모는 언니야, 아이다. 석이가 그런 말 안했고, 엄마가 자꾸만 지레 짐작으로 하는 말이라. 엄마가 한이 맺혀서 그라는 기라 카더라마는…
석이는 내 외사촌이다. 올해 대학 졸업반인 석이는 평범하기 그지없다. 평범하다는 말에는 현재의 석이가 연애하기 바쁘거나 혹은 취직자리에 골몰해 있을 거라는 말이 포함된다. 또한 평범하다는 말은, 석이가 전쟁터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일기를 썼던 이조시대의 위인이나 유배지에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읽어드릴 소설을 썼던 위대한 문학가처럼 효성이 지극하지 않다는 말과도 연결된다.
석이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머니, 할머니한테 잘 해 주세요. 이 담에 저도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한 것처럼 저도 해드릴 거니까요〉라는 말을 했을 리 없다는 말이 포함된다. 지극히 평범한 석이가 용돈을 팍팍 주시는 어머니-나한테는 숙모님-한테 현대판 고려장을 기약하며 아무런 힘이 없는 -혹은, 어쨌거나 숙모의 입장에서는 속 편히 치우지 못하는 고장난 벽시계 같기만 한- 할머니를 두고 은근한 협박조의 말을 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아직 순수한 나이였을 때, 이를테면 석이가 귀여운 여자친구가 만들어주던 풀꽃 반지 하나에 행복해하던 풋풋한 초등학생 시절에 잠시 그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을지 모른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석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젠가 나는 정말 오랜만에 석이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진 어투로 술값을 들고 학교 앞으로 나와달라는 전화였다. 학교 앞 주점에서 만난 석이는 `집에 안 들어간지 오래됐어. 뭐, 할머니? 할머니 방에 냄새 나서 안 들어간지 여러 달 됐어…'라고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러니 어머니가 막내 이모한테서 들은 말을 첨가해서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는 바였다. 그런 석이는 할머니가 일곱 살까지 업어서 키운 금지옥엽 손자이다. 언제부터인가 정신을 놓친 할머니의 기억으로는 늘 석이는 일곱 살이며, 늘 할머니 편이었다.
오 년 전 잠시 외할머니를 뵌 적이 있었다.
그 때만 해도 또렷하던 정신을 가지셨던 외할머니는 내 긴 머리를 보고 `요즘에는 참 이상도 하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죽어야 머리를 풀었는데…'라는 말로 못마땅하게 한 마디 하셨다. 바로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어머니는, `참, 어무니도… 구식이라카이…'라는 말로 되받아 치셨는데, 은근히 외할머니를 무시하는 말투여서 나는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오케이, 예스, 땡큐〉라는 말을 슬쩍슬쩍 섞어 쓰면서 시대에 편승해가는 앞뒤가 꽉 막히지 않는 현대식 할머니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마는 왜 저리 짧노? 참 요새 세상 못 말리겠다 쯧쯧…'하는 말을 하시곤 하셨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와 격이 다른 좀 더 세련된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계셨지만 내가 봐서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동격 내지는 아류격이었다. 어머니는 구식과 신식의 경계선을 늘 본위적으로 정하셨고, 어머니의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신식이 아니라 〈세상 망할 징조〉였다. 나는, 망할 징조를 동경하고 있었으나 패션에 관한 한 신식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나는 여하튼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였기 때문이다.
희망을 사람에게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
이십 년 지기 막역지우인 `라'는 남자가 아니라 변호사와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변호사의 아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말이 된다. 라는 연애하는 순간부터 변호사한테 인생의 희망을 걸기
난데없는 뚱딴지 같은 질문에 어머니는 섭섭했을 것이다.
"몇 번이고 그라카드라. 느이 외할매가 말이다."
칠순 어머니는 숨 가삐 아흔 고개를 넘으신 외할머니를 만나 뵙고 오시더니 연거푸 똑같은 말을 한숨처럼 내뱉으셨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복도 많지. 아부지가 그렇게 수발을 들어주시니…"
뒷말을 흐리는 어머니의 갈라진 음성 위로 마른 먼지가 풀썩거린다. 홀로 되신 지 십 년이 되는 동안 어머니는 다부지게 틈 하나 없이 살아 오셨지만, 먼지는 어쩔 수 없이 더께를 이루고 있다가 어느 순간 투툭 불거지곤 한다. 그것은 어머니의 말투에서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 스스로는 외로움을 매번 수장시킨다. 외로움들은 하루에도 수 십 번씩 물걸레질을 하는 어머니의 갈퀴진 손 안에서 숨을 죽인다.
이제는 했던 말만 똑같이 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 석이가 즈이 엄마보고 엄마요, 할매한테 잘 하이소. 안 그러면 내 이담에 커서 나도 어머니한테 똑같이 할겁니더 했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하는 기라. 느이 막내 이모는 언니야, 아이다. 석이가 그런 말 안했고, 엄마가 자꾸만 지레 짐작으로 하는 말이라. 엄마가 한이 맺혀서 그라는 기라 카더라마는…
석이는 내 외사촌이다. 올해 대학 졸업반인 석이는 평범하기 그지없다. 평범하다는 말에는 현재의 석이가 연애하기 바쁘거나 혹은 취직자리에 골몰해 있을 거라는 말이 포함된다. 또한 평범하다는 말은, 석이가 전쟁터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일기를 썼던 이조시대의 위인이나 유배지에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읽어드릴 소설을 썼던 위대한 문학가처럼 효성이 지극하지 않다는 말과도 연결된다.
석이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머니, 할머니한테 잘 해 주세요. 이 담에 저도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한 것처럼 저도 해드릴 거니까요〉라는 말을 했을 리 없다는 말이 포함된다. 지극히 평범한 석이가 용돈을 팍팍 주시는 어머니-나한테는 숙모님-한테 현대판 고려장을 기약하며 아무런 힘이 없는 -혹은, 어쨌거나 숙모의 입장에서는 속 편히 치우지 못하는 고장난 벽시계 같기만 한- 할머니를 두고 은근한 협박조의 말을 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아직 순수한 나이였을 때, 이를테면 석이가 귀여운 여자친구가 만들어주던 풀꽃 반지 하나에 행복해하던 풋풋한 초등학생 시절에 잠시 그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을지 모른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석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젠가 나는 정말 오랜만에 석이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진 어투로 술값을 들고 학교 앞으로 나와달라는 전화였다. 학교 앞 주점에서 만난 석이는 `집에 안 들어간지 오래됐어. 뭐, 할머니? 할머니 방에 냄새 나서 안 들어간지 여러 달 됐어…'라고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러니 어머니가 막내 이모한테서 들은 말을 첨가해서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는 바였다. 그런 석이는 할머니가 일곱 살까지 업어서 키운 금지옥엽 손자이다. 언제부터인가 정신을 놓친 할머니의 기억으로는 늘 석이는 일곱 살이며, 늘 할머니 편이었다.
오 년 전 잠시 외할머니를 뵌 적이 있었다.
그 때만 해도 또렷하던 정신을 가지셨던 외할머니는 내 긴 머리를 보고 `요즘에는 참 이상도 하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죽어야 머리를 풀었는데…'라는 말로 못마땅하게 한 마디 하셨다. 바로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어머니는, `참, 어무니도… 구식이라카이…'라는 말로 되받아 치셨는데, 은근히 외할머니를 무시하는 말투여서 나는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오케이, 예스, 땡큐〉라는 말을 슬쩍슬쩍 섞어 쓰면서 시대에 편승해가는 앞뒤가 꽉 막히지 않는 현대식 할머니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마는 왜 저리 짧노? 참 요새 세상 못 말리겠다 쯧쯧…'하는 말을 하시곤 하셨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와 격이 다른 좀 더 세련된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계셨지만 내가 봐서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동격 내지는 아류격이었다. 어머니는 구식과 신식의 경계선을 늘 본위적으로 정하셨고, 어머니의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신식이 아니라 〈세상 망할 징조〉였다. 나는, 망할 징조를 동경하고 있었으나 패션에 관한 한 신식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나는 여하튼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였기 때문이다.
희망을 사람에게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
이십 년 지기 막역지우인 `라'는 남자가 아니라 변호사와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변호사의 아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말이 된다. 라는 연애하는 순간부터 변호사한테 인생의 희망을 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