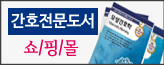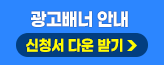제24회 간호문학상 - 수기 . 당선작
진 간호사의 병동 노트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2-26 오전 09:49:06
진경자(재독간호사)
할줄의 글이나 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불현듯 생생한 느낌을 가지고 우리 곁에 다가오는 때가 있다. 오직 한 가닥 희망을 위해 앞만 보고 숨가쁘게 살아온 이국생활이 이제 이순(耳順)을 넘겨 한가롭게 주변을 둘러볼 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이다.
어느 날 무심코 먼지가 앉은 서가를 정리하다 갈피에 손때가 묻은 다이어리 한 권이 내 시선을 끌었다. 내 나이 스물여덟에 독일에 와서 자신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나 새로운 감명을 받을 때마다 틈틈이 기록했던 글들을 대하니 새로웠고 아련한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며 잔잔한 파동으로 밀려왔다.
1. 오늘은 누구의 편지를 가지고 갈까? 근무 나갈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나는 마지막으로 편지가 들어 있는 서랍을 열고 차곡차곡 쌓인 편지 속에서 그 중 한 통을 꺼내어 핸드백 속에 찔러 넣는다. 서랍 속에는 비행기를 타고 온 편지들이 가득했다. ꡒ소윤 어미 보아라ꡓ로 시작되는 아버지의 구사체 편지와 한 때는 시인이 꿈이었던 언니가 보낸 미완성 시가 있고 어린 아들이 크레용으로 그린 비행기 안에 내 얼굴이 있는 그림과 성탄 카드 등이 빼곡히 차 있었다.
다섯 살 난 아들과 세 살 짜리 딸을 친정에 맡기고 간호사로 일자리를 찾아서 70년대에 지구를 반 바퀴나 돌아서 낯선 독일 땅에 온 나는 허허벌판에 처량하게 서 있는 허수아비처럼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였다. 오로지 매주마다 우편함에 들어오는 고국에서의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넘겼다. 고국에서 보내온 편지는 피로에 지친 심신을 잠깐이나마 쉬게 해주는 피로회복제였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눈치와 행동으로 근무하는 8시간을 내내 서서 일한다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독일 동료들은 어려서부터 우유와 버터를 많이 먹고 자라서 그런지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도 지칠 줄을 모르는데 우리 한국 간호사들은 금방 지치고 덩치 큰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도 힘에 겨웠다. 중환자로 입원한 환자의 허벅지가 우리 허리통보다 굵어 우리 시대에 뚱보라고 불렸던 백금녀나 오천평은 저리 가라하는 이들도 많았다.
피로에 지치고 외로움에 시달려도 고국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빨리 돈 벌어서 돌아가야지 하는 일념으로 스스로를 추슬렀지만 언어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힘에 겨운 육체노동은 아직 여리고 젊은 우리에게는 참기 힘든 형벌이었다.
이런 심신의 고통을 다독이는 처방으로 근무지에 편지를 한 통씩 들고 나와서 읽는 순간만은 행복했다. 짜증이 나고 피로할 때는 잠깐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편지를 가운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 안에서 편지를 읽으며 소리 죽여 한참씩 울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피로가 가시는 듯 했다. 이내 뺨에 얼룩진 눈물자국을 지우고 나와서 다시 맡은 일을 계속했다. 이렇듯 화장실을 찾는 빈도가 잦다보니 영문을 모르는 동료들은 내가 몸이 안 좋은 줄로 알고 진찰을 받아보라고 동정 어린 말을 걸어올 때도 있었다.
그토록 힘들게 보냈던 지난날들이 이제는 흘러간 세월 속에 한 낱 추억으로 남아 있다. 편지에만 의지하며 살던 시절은 옛이야기가 되었고 지금은 식구들이 그리울 때는 전화번호만 누르면 어디서나 시내통화처럼 대화할 수 있고 비행기도 날마다 몇 대씩 뜨고 있으니 보고 싶을 때는 맘만 먹으면 훌쩍 날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고국이 내가 떠나오던 때처럼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멀고 먼 나라가 아니고 이웃처럼 가깝게 되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니 들 수 없다.
2. 독일에서는 나이에 따라 며칠씩 차이는 있지만 어느 직장에서나 일년에 대략 4주 이상의 유급 휴가가 있다. 해 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야외로 나가 풀밭에 돗자리를 깔고 일광욕을 즐기는 철이 되면 이 나라 사람들은 너나 없이 일손을 놓고 연례행사처럼 여행을 떠난다. 마치 휴가를 가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같았다.
우리 한국 간호사들도 휴가를 받아 한인 여행사를 따라 이태리나 프랑스로 떠나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미혼의 간호사들은 배우자를 찾는 이벤트 여행으로 화제가 만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당치 않은 사치였고 모두 해당사항 없는 꿈같은 얘기일 뿐이었다. 휴가를 받으면 나는 다른 병원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아이들과 동생들 학비며 부모님 생활비를 생각하면 한 푼이라서 빨리 벌어서 집에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여름 휴가를 받아 내가 찾아간 곳은 카톨릭재단 병원이었다. 전화를 통해 면접 안내를 받기로 한 간호원장실을 안내실에 문의했더니 간호원장방은 복도 맨 끝이라 했다. 새로 실내 수리를 했는지 말끔히 단장된 복도 벽이며 주변들이 깔끔했다. 간호원장실에 당도하여 노크해도 반응이 없기에 손잡이를 흔들어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어떻게 할까, 지나가는
할줄의 글이나 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불현듯 생생한 느낌을 가지고 우리 곁에 다가오는 때가 있다. 오직 한 가닥 희망을 위해 앞만 보고 숨가쁘게 살아온 이국생활이 이제 이순(耳順)을 넘겨 한가롭게 주변을 둘러볼 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이다.
어느 날 무심코 먼지가 앉은 서가를 정리하다 갈피에 손때가 묻은 다이어리 한 권이 내 시선을 끌었다. 내 나이 스물여덟에 독일에 와서 자신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나 새로운 감명을 받을 때마다 틈틈이 기록했던 글들을 대하니 새로웠고 아련한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며 잔잔한 파동으로 밀려왔다.
1. 오늘은 누구의 편지를 가지고 갈까? 근무 나갈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나는 마지막으로 편지가 들어 있는 서랍을 열고 차곡차곡 쌓인 편지 속에서 그 중 한 통을 꺼내어 핸드백 속에 찔러 넣는다. 서랍 속에는 비행기를 타고 온 편지들이 가득했다. ꡒ소윤 어미 보아라ꡓ로 시작되는 아버지의 구사체 편지와 한 때는 시인이 꿈이었던 언니가 보낸 미완성 시가 있고 어린 아들이 크레용으로 그린 비행기 안에 내 얼굴이 있는 그림과 성탄 카드 등이 빼곡히 차 있었다.
다섯 살 난 아들과 세 살 짜리 딸을 친정에 맡기고 간호사로 일자리를 찾아서 70년대에 지구를 반 바퀴나 돌아서 낯선 독일 땅에 온 나는 허허벌판에 처량하게 서 있는 허수아비처럼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였다. 오로지 매주마다 우편함에 들어오는 고국에서의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넘겼다. 고국에서 보내온 편지는 피로에 지친 심신을 잠깐이나마 쉬게 해주는 피로회복제였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눈치와 행동으로 근무하는 8시간을 내내 서서 일한다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독일 동료들은 어려서부터 우유와 버터를 많이 먹고 자라서 그런지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도 지칠 줄을 모르는데 우리 한국 간호사들은 금방 지치고 덩치 큰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도 힘에 겨웠다. 중환자로 입원한 환자의 허벅지가 우리 허리통보다 굵어 우리 시대에 뚱보라고 불렸던 백금녀나 오천평은 저리 가라하는 이들도 많았다.
피로에 지치고 외로움에 시달려도 고국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빨리 돈 벌어서 돌아가야지 하는 일념으로 스스로를 추슬렀지만 언어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힘에 겨운 육체노동은 아직 여리고 젊은 우리에게는 참기 힘든 형벌이었다.
이런 심신의 고통을 다독이는 처방으로 근무지에 편지를 한 통씩 들고 나와서 읽는 순간만은 행복했다. 짜증이 나고 피로할 때는 잠깐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편지를 가운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 안에서 편지를 읽으며 소리 죽여 한참씩 울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피로가 가시는 듯 했다. 이내 뺨에 얼룩진 눈물자국을 지우고 나와서 다시 맡은 일을 계속했다. 이렇듯 화장실을 찾는 빈도가 잦다보니 영문을 모르는 동료들은 내가 몸이 안 좋은 줄로 알고 진찰을 받아보라고 동정 어린 말을 걸어올 때도 있었다.
그토록 힘들게 보냈던 지난날들이 이제는 흘러간 세월 속에 한 낱 추억으로 남아 있다. 편지에만 의지하며 살던 시절은 옛이야기가 되었고 지금은 식구들이 그리울 때는 전화번호만 누르면 어디서나 시내통화처럼 대화할 수 있고 비행기도 날마다 몇 대씩 뜨고 있으니 보고 싶을 때는 맘만 먹으면 훌쩍 날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고국이 내가 떠나오던 때처럼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멀고 먼 나라가 아니고 이웃처럼 가깝게 되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니 들 수 없다.
2. 독일에서는 나이에 따라 며칠씩 차이는 있지만 어느 직장에서나 일년에 대략 4주 이상의 유급 휴가가 있다. 해 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야외로 나가 풀밭에 돗자리를 깔고 일광욕을 즐기는 철이 되면 이 나라 사람들은 너나 없이 일손을 놓고 연례행사처럼 여행을 떠난다. 마치 휴가를 가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같았다.
우리 한국 간호사들도 휴가를 받아 한인 여행사를 따라 이태리나 프랑스로 떠나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미혼의 간호사들은 배우자를 찾는 이벤트 여행으로 화제가 만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당치 않은 사치였고 모두 해당사항 없는 꿈같은 얘기일 뿐이었다. 휴가를 받으면 나는 다른 병원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아이들과 동생들 학비며 부모님 생활비를 생각하면 한 푼이라서 빨리 벌어서 집에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여름 휴가를 받아 내가 찾아간 곳은 카톨릭재단 병원이었다. 전화를 통해 면접 안내를 받기로 한 간호원장실을 안내실에 문의했더니 간호원장방은 복도 맨 끝이라 했다. 새로 실내 수리를 했는지 말끔히 단장된 복도 벽이며 주변들이 깔끔했다. 간호원장실에 당도하여 노크해도 반응이 없기에 손잡이를 흔들어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어떻게 할까, 지나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