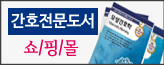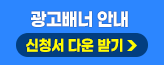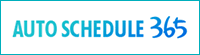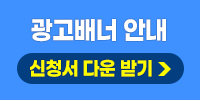제22회 간호문학상 시부문 가작
손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1-17 오전 10:37:21
손
김 진 이
푸른 녹색빛 바다의 눈에
비늘돋쳐 파닥이는 굵은 손마디
바다는
늘
새벽으로 몰리는 어둠을 그물질 하시던
아버지의 강이었다.
아직도 남은 자리를 채워야 한다며
조금만 더 벌어보자며 오르시던 새벽뱃길.
살아가야 하는 의무로 아팠던 발가락.
계속되는 노동이 어깨가장자리에 묻어
살갗을 파고 들던 땀냄새가 늦가을 차갑도록 시린
가난이 될 때쯤
나는 긴 강으로 떠내려가는 숱한 별을 주머니에 채우곤 했다.
아픈 발가락을 거스르는 세월속에
식구들이 안주하는 오늘.
아버지
별빛아래 주사기를 든 손을 보셨는지요.
◆당선 소감 - 김 진 이 (여수 원광한방병원)
겨울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사는 속에는 왜그리 모양좋은 변명이 많던지.
시라고 적어놓은 요게 내 삶의 작은 변명이 아닐는지…
가작으로 다가온 나의 봄.
이 손으로 얼만큼의 가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끄러운 변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진 이
푸른 녹색빛 바다의 눈에
비늘돋쳐 파닥이는 굵은 손마디
바다는
늘
새벽으로 몰리는 어둠을 그물질 하시던
아버지의 강이었다.
아직도 남은 자리를 채워야 한다며
조금만 더 벌어보자며 오르시던 새벽뱃길.
살아가야 하는 의무로 아팠던 발가락.
계속되는 노동이 어깨가장자리에 묻어
살갗을 파고 들던 땀냄새가 늦가을 차갑도록 시린
가난이 될 때쯤
나는 긴 강으로 떠내려가는 숱한 별을 주머니에 채우곤 했다.
아픈 발가락을 거스르는 세월속에
식구들이 안주하는 오늘.
아버지
별빛아래 주사기를 든 손을 보셨는지요.
◆당선 소감 - 김 진 이 (여수 원광한방병원)
겨울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사는 속에는 왜그리 모양좋은 변명이 많던지.
시라고 적어놓은 요게 내 삶의 작은 변명이 아닐는지…
가작으로 다가온 나의 봄.
이 손으로 얼만큼의 가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끄러운 변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