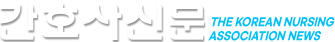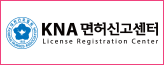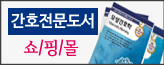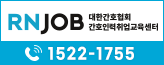정부는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유행은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한다.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했으며, 국가별 행동계획 마련 및 국제 공조를 촉구한 바 있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의 주요 행동계획에도 항생제 내성이 포함되는 등 선진국들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국가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9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UN 총회에서도 항생제 내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산출기준이 유사한 OECD 12개국 평균보다 3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지난해 44%로 감소 추세지만 최근 4년간 44∼45%에 정체돼 있는 실정이다.
항생제 내성률도 인체 및 가축 모두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포도상구균의 메티실린 내성률(MRSA)의 경우 67.7%로 영국 13.6%, 프랑스 20.1%, 일본 53% 등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알균의 반코마이신 내성률(VRE)은 36.5%로 영국 21.3%, 독일 9.1%, 프랑스 0.5% 대비 월등히 높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항생제 사용지침 확산, 전문인력 확충 및 수가 보상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감염에 취약한 진료환경 개선,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 환자 전원 시 내성균 정보 공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한 보건·농축수산·식품·환경 분야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내성균 전수감시 및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실시키로 했다.
민관학 합동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구성해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해 항생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범부처 대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R&D 투자를 강화키로 했다.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에 참여하고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 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과제별 세부행동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