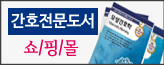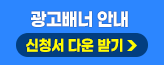제32회 간호문학상 수필 당선작
늙은이와 꽃신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11-12-15 오전 09:38:56
- 박지은 (보은요양병원)
할머니 하고 부르면 “이년아. 왜 불러.” 한다. 어르신 하고 부르면 “귀찮아!” 라고 하며, “은순씨~” 하고 부르면(남자가) “네.” 라며 고개를 숙인다. 여자라 이거다. 늙어도, 주름이 많아도, 백내장에 앞이 잘 안보여도, 눈뜨면 밥 찾고, 밥 먹어도 밥 찾는 치매 늙은이 라도 말이다.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누구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연인의 경우에도 귀 기울여 들으면 구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오감이란 것은 너무도 신기하고 대단한 것이 관심만 있으면 알 수가 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차이. 그건 답이 없는 진실인 거다. 은순씨의 질질 끌면서 탁탁 거리는 특위의 꼬부랑거리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웃음이 비실비실 새어 나온다. 그 탁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욕을 해대는데 오만가지 신기한 욕들은 향기롭기만 하다.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웬 놈의 부랄 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은순씨가 걸어온다. 회색 빛깔 짧은 까까머리에 축 처진 젖가슴이 아랫배에 닿을 정도로 등이 굽어 같이 처진 눈꺼풀, 백내장에 탁한 눈동자로 고개만 간신히 들어 나를 바라본다. 배고파 이년아. 라며 욕을 한다. 그녀의 욕은 맛깔 난다. 보고 있고, 듣고 있노라면 해학적이기 까지 하다. 삶은 때론 이런 반대적인 상황에서 풋풋한 행복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걸까.
세월은 모든 것을 앗아 간다. 청부 살인업자 같기도, 악랄한 사채업자 같기도 하다. 때론 그것들이 모두 허무하다고 하여도, 추억마저 앗아 가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
인생의 대부분은 공상과 망상이 차지한다.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을 꿈꾸고, 걱정하고, 때론 그것이 진실인 냥 두려워한다. 과거를 회상하는 건 거의 매일이다. 좋았던 것들뿐만 아니라 나쁜 기억마저도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낸다. 그런 우리에게 추억을 잃는 다는 것은 어쩌면 정신적인 죽음인지도 모른다.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간호하는 건 때론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이도 잊고, 자식들의 이름도 잊는다. 사랑했던 것들을 잊어간다.
병동 할머니 중에 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이 멀다 자식들을 찾는 노인이 있다. 오죽하면 간호사들이 그녀의 자식들 이름을 줄줄 외울 정도다. “전화를 해 달라, 불러 달라, 나 죽는다고 연락하면 올 거다, 나를 이곳에 놓고 다들 떠났다, 보고 싶다, 보고 싶어 죽겠다.” 라고 한다. 처음 들었을 땐 짠하기도 한데, 늘상 듣는 노랫소리처럼 이젠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한다. “어른신 딸래미 열흘만 자면 온데.”라고. 때론 운다. 눈물을 흘리며 배가 고프다 아프다 하며 자식을 불러 달라 말하고, 따끈한 두유한잔을 주며 달래면 고맙다고 그세 눈물을 딱 삼킨다.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된다고 했던가. 딱 그 짝이다. 하는 짓도 아이 같고, 달래는 방법도 모두 아이 같다. 우리는 아이를 돌봐 본적이 없지만 아마 치매에 걸린 노인과 아이는 한 끗 차이가 아닐까. 겉모습, 목소리는 달라도. 걸음걸이, 참, 느릿느릿 어정쩡한 걸음걸이는 흡사 어린아이 같기도 하다.
은순씨의 자식들이 오던 날이었다. 일흔이 여든이 훌쩍 넘은 그녀의 자식들은 모두 환갑이 지났다. “안녕하세요 봉할머니 따님이세요?” 라고 묻지만 실지로 그들도 우리에겐 참으로 어르신이나 다름없다. 그녀는 본인의 나이를 마흔으로 기억하고 있는 귀여운 치매환자. 그녀는 딸의 얼굴과 이름은 알지만 딸의 나이는 모르고, 손녀가 있는 걸 알지만 시집간 손녀의 얼굴은 잘 모른다.
“할머니 신발이 너무 닳았어요. 바닥도 너무 딱딱해서 할머니가 발이 아프다고 하시네요. 푹신푹신한 건강신발 좀 사다 주시겠어요.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으면 더 좋겠네요.”라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고마워요 간호사님.”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했던 그녀의 이쁜 딸. 할머니가 기다리던 딸이 왔다. 환갑 넘은 그녀의 얼굴에 내 얼굴이 보이고, 긍이 굽은 욕쟁이 은순씨 얼굴에 엄마의 얼굴이 보인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고 웃는다. 누구 보다 환하게.
그녀가 사온 새 신발은 흰색 낮은 푹신한 건강신발이다. 신고 벗기 편하고 무엇보다 부드러운 재질이지만 바닥만은 오돌토돌한 고무재질로 미끄럼 방지가 되어있다.
“와, 할머니 이거 디게 좋다. 편하시겠어요. 역시 딸이 최고네요.” “이년아 최고긴 뭐가 최고여!” 무표정한 할머니 얼굴에 입 꼬리가 슬쩍 올라간다. 광대 쪽에 붙은 발그레한 늙은 볼따구도 슬쩍 위로 상승. 축 처진 눈은 그대로지만 분명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 신발을 만지작거리다가 딸내미가 신고 온 분홍색 구두를 만진다. 꽃이 달린 평범한 아줌마용 구두였다. 아가씨들 것과는 다르게 나이가 들어 보이면서도 편하게 생긴. “이게 더 이쁘네. 이년아 이거 나 주고 가.” 그녀의 한마디에 병실은 모두 웃음바다가 되었다.
은순씨 솔직히 저도 흰색 보단 분홍색이 예쁘네요. 그래 그녀도 여자라 이거다. 계속 만지작거리는 통에 그녀의 딸은 사온 건강신발과 본인이 신고 왔던 구두를 벗어 놓고는 할머니의 낡은 슬리퍼를 신고 가뿐히 병동을 나섰다.
오늘도 해가 진다. 하루가 끝이 나고 다시 하루가 시작된다. 나이가 들면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고 했던가. 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 마음도 시간도 예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속도와 다른 질감인 것 같다. 그래서 또 좋은 것도 있다. 그때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기쁨과 눈물 흘리면서 웃을 수 있는 추억도 함께 가져간다는 것.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것은 역시 따끔하다.
그건 그렇고, 꽃신을 고이고이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자는 은순씨의 꿈속은 지금 어디쯤일까.
할머니 하고 부르면 “이년아. 왜 불러.” 한다. 어르신 하고 부르면 “귀찮아!” 라고 하며, “은순씨~” 하고 부르면(남자가) “네.” 라며 고개를 숙인다. 여자라 이거다. 늙어도, 주름이 많아도, 백내장에 앞이 잘 안보여도, 눈뜨면 밥 찾고, 밥 먹어도 밥 찾는 치매 늙은이 라도 말이다.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누구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연인의 경우에도 귀 기울여 들으면 구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오감이란 것은 너무도 신기하고 대단한 것이 관심만 있으면 알 수가 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차이. 그건 답이 없는 진실인 거다. 은순씨의 질질 끌면서 탁탁 거리는 특위의 꼬부랑거리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웃음이 비실비실 새어 나온다. 그 탁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욕을 해대는데 오만가지 신기한 욕들은 향기롭기만 하다.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웬 놈의 부랄 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은순씨가 걸어온다. 회색 빛깔 짧은 까까머리에 축 처진 젖가슴이 아랫배에 닿을 정도로 등이 굽어 같이 처진 눈꺼풀, 백내장에 탁한 눈동자로 고개만 간신히 들어 나를 바라본다. 배고파 이년아. 라며 욕을 한다. 그녀의 욕은 맛깔 난다. 보고 있고, 듣고 있노라면 해학적이기 까지 하다. 삶은 때론 이런 반대적인 상황에서 풋풋한 행복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걸까.
세월은 모든 것을 앗아 간다. 청부 살인업자 같기도, 악랄한 사채업자 같기도 하다. 때론 그것들이 모두 허무하다고 하여도, 추억마저 앗아 가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
인생의 대부분은 공상과 망상이 차지한다.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을 꿈꾸고, 걱정하고, 때론 그것이 진실인 냥 두려워한다. 과거를 회상하는 건 거의 매일이다. 좋았던 것들뿐만 아니라 나쁜 기억마저도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낸다. 그런 우리에게 추억을 잃는 다는 것은 어쩌면 정신적인 죽음인지도 모른다.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간호하는 건 때론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이도 잊고, 자식들의 이름도 잊는다. 사랑했던 것들을 잊어간다.
병동 할머니 중에 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이 멀다 자식들을 찾는 노인이 있다. 오죽하면 간호사들이 그녀의 자식들 이름을 줄줄 외울 정도다. “전화를 해 달라, 불러 달라, 나 죽는다고 연락하면 올 거다, 나를 이곳에 놓고 다들 떠났다, 보고 싶다, 보고 싶어 죽겠다.” 라고 한다. 처음 들었을 땐 짠하기도 한데, 늘상 듣는 노랫소리처럼 이젠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한다. “어른신 딸래미 열흘만 자면 온데.”라고. 때론 운다. 눈물을 흘리며 배가 고프다 아프다 하며 자식을 불러 달라 말하고, 따끈한 두유한잔을 주며 달래면 고맙다고 그세 눈물을 딱 삼킨다.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된다고 했던가. 딱 그 짝이다. 하는 짓도 아이 같고, 달래는 방법도 모두 아이 같다. 우리는 아이를 돌봐 본적이 없지만 아마 치매에 걸린 노인과 아이는 한 끗 차이가 아닐까. 겉모습, 목소리는 달라도. 걸음걸이, 참, 느릿느릿 어정쩡한 걸음걸이는 흡사 어린아이 같기도 하다.
은순씨의 자식들이 오던 날이었다. 일흔이 여든이 훌쩍 넘은 그녀의 자식들은 모두 환갑이 지났다. “안녕하세요 봉할머니 따님이세요?” 라고 묻지만 실지로 그들도 우리에겐 참으로 어르신이나 다름없다. 그녀는 본인의 나이를 마흔으로 기억하고 있는 귀여운 치매환자. 그녀는 딸의 얼굴과 이름은 알지만 딸의 나이는 모르고, 손녀가 있는 걸 알지만 시집간 손녀의 얼굴은 잘 모른다.
“할머니 신발이 너무 닳았어요. 바닥도 너무 딱딱해서 할머니가 발이 아프다고 하시네요. 푹신푹신한 건강신발 좀 사다 주시겠어요.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으면 더 좋겠네요.”라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고마워요 간호사님.”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했던 그녀의 이쁜 딸. 할머니가 기다리던 딸이 왔다. 환갑 넘은 그녀의 얼굴에 내 얼굴이 보이고, 긍이 굽은 욕쟁이 은순씨 얼굴에 엄마의 얼굴이 보인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고 웃는다. 누구 보다 환하게.
그녀가 사온 새 신발은 흰색 낮은 푹신한 건강신발이다. 신고 벗기 편하고 무엇보다 부드러운 재질이지만 바닥만은 오돌토돌한 고무재질로 미끄럼 방지가 되어있다.
“와, 할머니 이거 디게 좋다. 편하시겠어요. 역시 딸이 최고네요.” “이년아 최고긴 뭐가 최고여!” 무표정한 할머니 얼굴에 입 꼬리가 슬쩍 올라간다. 광대 쪽에 붙은 발그레한 늙은 볼따구도 슬쩍 위로 상승. 축 처진 눈은 그대로지만 분명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 신발을 만지작거리다가 딸내미가 신고 온 분홍색 구두를 만진다. 꽃이 달린 평범한 아줌마용 구두였다. 아가씨들 것과는 다르게 나이가 들어 보이면서도 편하게 생긴. “이게 더 이쁘네. 이년아 이거 나 주고 가.” 그녀의 한마디에 병실은 모두 웃음바다가 되었다.
은순씨 솔직히 저도 흰색 보단 분홍색이 예쁘네요. 그래 그녀도 여자라 이거다. 계속 만지작거리는 통에 그녀의 딸은 사온 건강신발과 본인이 신고 왔던 구두를 벗어 놓고는 할머니의 낡은 슬리퍼를 신고 가뿐히 병동을 나섰다.
오늘도 해가 진다. 하루가 끝이 나고 다시 하루가 시작된다. 나이가 들면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고 했던가. 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 마음도 시간도 예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속도와 다른 질감인 것 같다. 그래서 또 좋은 것도 있다. 그때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기쁨과 눈물 흘리면서 웃을 수 있는 추억도 함께 가져간다는 것.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것은 역시 따끔하다.
그건 그렇고, 꽃신을 고이고이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자는 은순씨의 꿈속은 지금 어디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