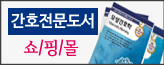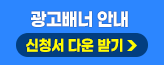제32회 간호문학상 시 가작
시를 쓰라 한다면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11-12-15 오전 09:15:50
- 김하림 (연세대 간호대학 2학년)
들여다 볼 우물을 만나고,
햇발 속삭이는 돌담을 걸어야 시가 나오지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다고?
매일의 아침이 오색으로 펼쳐지고,
속눈썹 끝에 매달린 낮잠을 그저 달게 잘 수 있었던 사람일 테지
스누즈 알람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하루 종일 눈가에 잠이 처덕처덕 붙어 있어도,
뗄 겨를 없이 매일을 반복하다보면
바퀴를 보면 또 굴려야 할 것 같아서 욕지기만 치미는 걸.
누군가에게 뜨겁지 못한 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했나.
누구를 위해, 무어를 태워야 하는지,
재가 되도록 불태울 장작은커녕,
불 번지지 않고 탈 수 있는 단단한 아궁이도 없이
이 따위 미적지근한 누런 불빛으론
계란이라도 하나 익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구도 연탄재 찰만큼 뜨거울 리 없지.
연희동 파 할머니 이마의 땀 훔치는 순간이 그림처럼 읽혀야
내 시의 밑그림이라도 그릴 텐데,
열한시 반,
팔다 남은 파처럼 축 늘어져 마을버스에서 내리면,
시장은 이미 파한지 오래.
“할머니, 내일은 저도 다듬어 파셔야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풀처럼 일어날 기회를 달라.
백설 위에 카악 카악 기침 끌어올릴 용기를 달라.
무등 앞에서 빈곤을 반추하며 그 가치를 음미할 짬이라도 달라.
비상하는 을숙도의 새떼 앞에 주저앉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젊은 시인의 한탄을 우리는 매일 반복하고
낯설게 하기라는 이름 아래,
뒤틀린 언어로 토하듯 뱉어낸 시들을 묶은
젊은 시인의 시집을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집어 들지.
이 가운데 나더러 시를 쓰라 한다면
난 할 말이 없다.
들여다 볼 우물을 만나고,
햇발 속삭이는 돌담을 걸어야 시가 나오지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다고?
매일의 아침이 오색으로 펼쳐지고,
속눈썹 끝에 매달린 낮잠을 그저 달게 잘 수 있었던 사람일 테지
스누즈 알람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하루 종일 눈가에 잠이 처덕처덕 붙어 있어도,
뗄 겨를 없이 매일을 반복하다보면
바퀴를 보면 또 굴려야 할 것 같아서 욕지기만 치미는 걸.
누군가에게 뜨겁지 못한 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했나.
누구를 위해, 무어를 태워야 하는지,
재가 되도록 불태울 장작은커녕,
불 번지지 않고 탈 수 있는 단단한 아궁이도 없이
이 따위 미적지근한 누런 불빛으론
계란이라도 하나 익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구도 연탄재 찰만큼 뜨거울 리 없지.
연희동 파 할머니 이마의 땀 훔치는 순간이 그림처럼 읽혀야
내 시의 밑그림이라도 그릴 텐데,
열한시 반,
팔다 남은 파처럼 축 늘어져 마을버스에서 내리면,
시장은 이미 파한지 오래.
“할머니, 내일은 저도 다듬어 파셔야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풀처럼 일어날 기회를 달라.
백설 위에 카악 카악 기침 끌어올릴 용기를 달라.
무등 앞에서 빈곤을 반추하며 그 가치를 음미할 짬이라도 달라.
비상하는 을숙도의 새떼 앞에 주저앉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젊은 시인의 한탄을 우리는 매일 반복하고
낯설게 하기라는 이름 아래,
뒤틀린 언어로 토하듯 뱉어낸 시들을 묶은
젊은 시인의 시집을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집어 들지.
이 가운데 나더러 시를 쓰라 한다면
난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