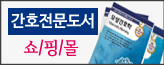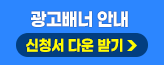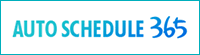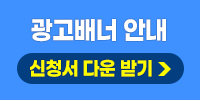27회 수기 가작
그대 앞에 꽃피는 하늘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7-01-08 오전 08:28:48
- 최 순 복(대구서구보건소)
나를 태운 버스한대가 뿌연 먼지를 날리며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덜컹거리며 달려가고 있었다.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간호학생 시절 정신과 병동 실습을 하며 만났던 환자들을 떠올렸다.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들,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되어가는 목석과 같은 형상들, 스스로 마주할 수 있는 현실과 아주 멀리 떠나온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러한 환자를 향한 간호의 첫발을 내딛기 위한 정신과 간호사 기숙사로 향하는 나는 이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인지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다.
그로부터 10여년의 시간이 흘렀을까! 간호사로서 환자를 처음 만나는 바로 전날 밤이 떠오른다. 환자를 향한 무작정 측은한 감정이 아닌 따듯한 가슴으로 그들을 성심껏 돌보리라는 처음의 생각을 가슴에 다지고 있었다.
그렇게 나의 일이 익숙해져갈 무렵의 어느 날이었다. 업무를 마치고 그날따라 몹시 피로를 느끼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가슴이 막힐 듯이 답답해왔다. 무엇인가 목에 걸리는 것 같아 속으로 컥컥 거리며 화장실로 뛰어갔다. 가래가 채었나싶어 기침을 하고보니 검붉은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객혈 같았다. 나의 등 뒤로 무슨 일이냐는 김간호사의 음성이 들려왔다. 소리 없이 나의 생명이 스러져가는 어두운 그림자를 느끼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지독한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어제까지도 내 마음의 하늘에 희망의 밀알을 찧어대던 두 마리 토끼도 나를 피해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진단 결과는 폐결핵! 이제 정신과 간호사로서 꿈을 펼치려 하는데 결핵이라니, 희망으로 뛰놀던 세상은 내편이 아닌 듯 어둡고 무서운 모습으로 내 앞에 서있었다. 아침이면 밤 동안 목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가래를 소리죽여 뱉어내며 한주먹이나 되는 약을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로 숨어들어 아무도 모르게 약을 먹는 일이 계속되었다. 무엇보다 근심스러운 것은 환자에게 전염을 시키면 어쩌나 하는 생각과 과연 나의 결핵이 치료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러한 막연한 걱정들로 하루하루가 힘겹게 지나가고 있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거리에 일렁이던 어느 날,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가 대장암 말기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다급한 오빠의 목소리였다. 위암으로 투병중이시던 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후 부모로서 어머니 혼자 남겨진 이 땅위에 코흘리개 우리 사남매는 어머니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해야 했다. 보따리장사라도 하지 않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날들이 이어졌다. 매일 그날그날 팔아야 할 옷가지를 머리에 이고 눈보라를 헤치며 어디론가 가야만 하는 고통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 어머니가 암이라니! 대장암수술을 받으시던 날, 보호자 대기실에서 가슴을 졸이던 나는 입이 바짝바짝 타는 것을 느꼈다. 시계를 보니 4시간이나 흘러있었다.
‘수술 중’에서 ‘회복 중’으로 보호자안내 전광판이 바뀌자 눈물이 울컥 앞을 가렸다. 그 후 입 퇴원을 거듭하며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지쳐갔고, 손과 발바닥은 부작용으로 갈라지고 피가 흐르며 고통으로 신음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 후로 퇴근 후면 나는 어머니의 갈라진 발바닥을 눈물로 바라보며 치료를 해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날카로운 고통을 인내해야하는 어머니의 병마 앞에 내 몸에 찾아온 결핵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감기 걸려 며칠 약 먹고 푹 쉬고 나면 씻은 듯 나을 것 같은 지나가는 질병 앞에 난 너무 나약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질 것이다.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앞에 어둠이 몰려와도 병마에서 내려오면 너도 걸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눈물이 나는 것을 감추려는 듯 등을 돌리셨다. 이토록 희미하게 바래가는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신 것은 억세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한 딸이 여자 혼자서 직장생활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워야하는 험한 세상에 남겨질 나를 걱정하고 계신 것이 분명했다.
나의 이러한 홀로서기가 당신의 고통 속에 무거운 짐이 되고 더 큰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암세포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육신에 남겨진 저리도록 아픈 당신의 고달픈 상처를 이 병든 몸뚱이로 어떻게 간호 할 수 있을지 아득한 일이었다. 내가 건강해져야 어머니를 간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몸을 벌떡 일으켰다. 하지만 어느새 또다시 내려앉은 캄캄한 어둠으로 한걸음도 내딛을 수가 없었다. 도무지 어디쯤 와있는지 가늠할 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