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구조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시도됐다.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평가도구를 한글로 번역해 사용했다.
이는 이영주 부산대병원 간호사의 간호학 석사학위논문(부산대) `중환자실 환자의 수면평가'에서 밝혀졌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다양한 신체·심리·환경적 요인들과 의료진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영주 간호사는 “간호사가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이용해 환자의 수면의 질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연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부산소재 1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 중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으며 지남력이 있는 환자와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했다.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 진행했다.
환자의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는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Richards-Campbell Sleep Questionnaire(RCSQ)를 번역해 사용했다. RCSQ는 대상자의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문항 5개와 소음수준에 대한 문항 1개로 구성돼 있다.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문항은 △수면의 깊이 △잠들기 △깨지 않고 잠들기 △깨었다가 다시 잠들기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다. 0∼100점 척도(10점 간격)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환자들의 수면의 질 평균 점수는 55.5점으로,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로 번역된 수면의 질 평가도구를 검증하기 위해 간호사가 평가한 결과와 환자가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비교해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확인 결과 간호사와 환자가 평가한 수면의 질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환자들은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통증'을 꼽았다. 이어 활동제한, 간호처치, 소음 순으로 나타났다. 기기부착, 실내온도, 조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환자들은 가장 큰 소음원으로 모니터 경보음을 꼽았다. 이어 전화벨 소리, 체위변경 및 기관흡인 소리, 의료진의 대화 순이었다.
간호연구논문
<논문> 중환자실 환자 수면상태 '평가도구' 확인 후 중재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9-04 오후 05:2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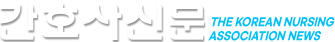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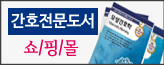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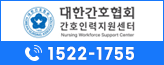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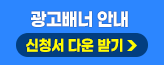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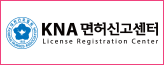





.gif)

